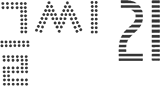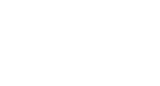서예·캘리그라피 Calligraphy
-

[Review]
죽림 정웅표 서예전
전시장 전경지난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백악미술관에서 죽림(竹林) 정웅표 선생의 개인전이 열렸다. 죽림 선생은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 이사를 역임하고 국제서예가협회 감사, 한국서예학술회 회장을 지냈으며 세계청소년서예대전, 한국미술협회 미술대전 등을 심사했다. 죽림 정웅표 · 檜作寒聲風過夜 梅含春意雪殘時 · 40×38cm죽림 선생은 홍성군 서부면에서 태어나 서부초등학교, 갈산중학교, 홍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출향했다. 죽림 선생의 서예 인생은 홍성고등학교에서 이윤섭 미술 교사를 만나 글씨를 배우면서 시작됐다. 이후 일중(一中) 김충현 서예가를 사사하여 실력을 갈고닦았다. 죽림 선생은 “부모는 내게 육신을 주셨고, 스승은 정신을 주셨다”며 스승의 가르침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하였음을 강조했다. 죽림 정웅표 · 太平春 · 70×205cm죽림 선생은 자유자재의 서체 혼용과 걸림 없는 운필에 능통하다. 선생의 작품을 보면 물 흐르듯 유려한 글씨와 자유롭게 뻗어 나가는 획들이 힘있게 느껴지며, 글씨에는 힘찬 기운이 감도는 듯하고 글자 하나하나에서 생동감 있는 동적인 기운이 넘쳐난다. 죽림 정웅표 · 太平春酒人同醉 柳墅芳堂天賜開閑 · 55×34cm죽림 선생은 지난 전시에서 “글자 한 자, 한 자에 흐름이 있고 그것이 전체의 흐름을 이루며 이질감이 없도록 표현하는 것에 제일 신경을 곤두세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그는 각각의 획의 흐름이 전체의 커다란 맥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둔다. 죽림 정웅표 · 和堯仙東井龍 요선의 동정 운에 화하다 · 34×138cm글자의 모양이 모두 제각각인 탓에 획을 그을 때는 저마다 다른 흐름으로 나아가지만 결국 한 자 한 자가 모여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므로 서예가는 전체적인 숲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각각의 나무, 즉 글자가 어떻게 보일지에만 신경 쓴다면 작품 전체의 생명력이 감소한다. 죽림 정웅표 · 送彝齋尙書赴燕 연경에 가는 이재 상서를 보내다 · 70×205cm또한, 죽림 선생은 “글씨를 글씨라고 생각하지 말고 맑은 선을 만들면 된다. 글씨 자체는 선으로 공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선을 연구하면 훨씬 쉽다”라며 글씨를 글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 서예는 숙련되기 전까지 매우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예를 익히는 것은 정신을 갈고 닦는 수양과도 같다. 죽림 정웅표 · 送諸秀才尋白雲書院 백운동서원을 찾은 수재들을 보내며 - 丹谷 · 19×26cm글씨라는 것은 선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예에 있어서 선 긋기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선으로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는 죽림 선생의 말처럼 맑은 선이 결여된 서예는 자칫 공허해지기 쉽다. 기본에 충실할 때 비로소 본연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 서예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죽림 정웅표 · 秋史先生詩 · 34×138cm죽림 선생의 내공 있는 작품은 서예인들은 물론 일반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개인전이 개최되면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전시회장을 찾는다. 이번 전시회는 봄기운과 함께 찾아온 고고한 묵향을 맞이한 뜻깊은 전시였으며, 죽림 선생의 다음 작품들을 하루빨리 만나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2021. 3. 10객원기자 신혜영<전시 정보>죽림 정웅표 서예전전시기간 : 2021. 2. 18(목) ~ 2. 24(수)전시장소 : 백악미술관
-

[News]
화가畫家의 글씨, 서가書家의 그림
전시장 전경올해로 김종영미술관이 개관한 지 20년이 되었다. 김종영의 삶을 살펴보면 볼수록 기존의 20세기 한국 미술사 기술을 되새기게 된다. 특히 몇 년 전부터 ‘단색화’가 국내외 미술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소비되는 것을 보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되묻게 된다. 지난 세기 한국 미술사를 어떤 관점에서 기술할 것인가로 귀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화가의 글씨, 서가의 그림』전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김종영 · 소림도(疏林圖) · 87×63cm 이번 전시에는 김광업(1906~1976)과 최규명(1919~1999) 두 분의 서예가와 걸레 스님으로 알려진 시인이자 서화가 중광(1934~2002), 그리고 이응노(1904~1989)와 황창배(1947~2001) 동양화가 두 분과 서양화가 곽인식(1919~1988), 김환기(1913~1974), 정규(1923~1971), 한묵(1914~2016) 네 분, 조각가 김종영(1915~1982), 비디오 작가 백남준(1932~2006) 해서 총 열 한 분의 작고 작가 작품을 전시한다. 연배로 보면 이응노와 김광업은 ‘경술국치’ 이전에 태어났고, 네 분의 서양화가와 김종영은 일제강점기 동경 유학을 했으며, 백남준과 중광은 해방 후 우리 손으로 설립한 미술대학에서 교육받은 일 세대 작가인 앵포르멜 세대와 동년배이며, 황창배는 해방둥이라 할 수 있다. 전통 서화에서 미술로 전환되던 시기에 서예와 미술에 정진한 작가들이다.최규명 · 요산 · 63×125cm, 이번 전시에서 작가군을 나누는 기준은 ‘서예’ 이다. 더불어 이 분들은 제도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작업 세계를 발전시켜 나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미술가들은 서예를 통해 체득한 미감을 어떻게 ‘자기화’했는지 살펴보고, 서예가들은 어떻게 서예를 ‘현재화’하고자 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이분들이 생전에 남긴 중요한 어록을 작품과 함께 전시하여, 이 작가분들이 어떤 자세로 서양미술을 수용했는지 이분들의 고뇌를 헤아려 보고자 했다. 한묵 · 비도 · 55×69cm, 3전시실에는 미술가로 특별히 서예에 정진하지는 않은 작가인 김환기, 백남준, 정규의 작품을 전시했다. 서예에 정진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의 미감과 작품관이 우리 전통에서 비롯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전시실에는 서예를 공통분모로 해서 화가, 조각가, 서예가의 작품을 전시했다. 물성에 관심을 가지고 개념미술로 볼 수 있는 작업을 했던 곽인식, 말년에 우주관에 기반을 둔 기하학적 추상에 전념한 한묵, 추사와 세잔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불각의 미를 추구한 김종영, 서예와 문인화 전통에 기반을 두고 추상화를 시도한 이응노, 서구 미술 사조를 가미해 동양화를 현재화하고자 노력했던 황창배의 작품과 함께 추사와 위창의 서예 전통을 이어 새로운 경지에 도달한 의사 출신의 서예가 김광업, 서예의 회화성에 천착해 회화와 서예의 경계를 넘나든 최규명, 그리고 선화(禪畵) 전통을 통해 한국의 피카소라는 극찬을 받은 중광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했다. 황창배 · 무제 · 337×150cm1전시실에서 들어서면 누가 서예가고 누가 화가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 생전에 이분들은 전통 서예를 토대로 서양미술을 수용하고, 현재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3전시실의 작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20세기 한국 미술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1958년 앵포르멜의 출현을 한국 현대미술의 출발점이라고 기술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2021. 3. 11자료제공 : 김종영미술관 <전시정보>김종영미술관 개관 20년 기념전 『화가畫家의 글씨, 서가書家의 그림』전시기간 : 2021. 3. 5(금) ~ 4. 25(일) (매주 월요일 휴관)전시장소 : 김종영미술관 전관 (서울 종로구 평창32길 30)초대작가 : 곽인식, 김광업, 김종영, 김환기, 백남준, 이응노, 정규, 중광, 최규명, 한묵, 황창배
-

[Preview]
(사)일중선생기념사업회 우수작가 초대전 신산 김성덕 서전
신산 김성덕 서전(사)일중선생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가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백악미술관 1, 2층 전시실에서 《우수작가초대전》을 개최한다.신산 김성덕 선생기념사업회가 2014년부터 주관하고 있는 《우수작가초대전》은 현재 서예계에서 주목받는 중견작가의 전시를 개최해 새롭게 변모해가는 한국 서예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데 그 취지가 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우수작가초대전》의 선정작가는 신산(信山) 김성덕(b.1965) 선생이다. 신산 김성덕 · 朱熹 觀書有感 · 90×150cm김성덕 선생은 호남 서예계를 대표하는 학정 이돈흥(1947~2020) 선생의 지도아래 40년 넘게 묵묵히 서예에만 정진해 온 저력 있는 서예가이다. 그의 작품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부산서예비엔날레》, 《동아시아 필묵의 힘》 등을 비롯해 국내외 굵직한 전시를 통해 소개된 바 있다. 신산 김성덕 · 採根譚句 · 97×150cm전남 신안 하의도의 농가에서 태어난 작가는 서예에 대한 열망 하나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서예를 연마해 왔다. 배움에 대한 간절함으로 스스로 학비를 벌어 원광대학교 서예과에 진학해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면서도 그 고통과 번민을 서예가 주는 희열과 감동으로 다스리며 글씨에만 정진해 온 작가다. 서예에 쏟은 작가의 열정과 성심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그의 작품에서 그대로 드러난다.신산 김성덕 · 춘향가 중에서 · 90×150cm중국 고대 청동기에 새겨진 종정문(鐘鼎文)부터 대나무 조각에 새겨진 한간문(汗柬文), 명•청대의 행초서에 심취해 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그간의 성과를 응축한 대작들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은 옛 글씨에 잠재된 역동성과 생동감을 예스럽되 낡지 않은 방식으로 드러낸다. 획의 강약, 글자의 모임과 흩어짐이 세(勢)를 이루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동하는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작가의 심경을 그린 하나의 풍경화다. 신산 김성덕 · 韋應物 寄全椒山中道士 · 63×42cm그중에서도 당나라 위응물(韋應物, 737~791)의 시에 그림을 곁들인 작품은 ‘시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詩中有畵, 畵中有詩)’는 옛말을 그대로 옮긴 듯하다. 불현듯 산에 사는 친구가 걱정되어 술 한 병 들고 찾아가니 빈 산에 낙엽만 가득했다는 시의 내용은 산을 그린 획 주변에 이리저리 튄 먹 자국들도 마치 추풍에 휘날리는 낙엽처럼 보이게 한다.신산 김성덕 · 論語 里仁篇節錄 · 90×150cm금속과 나무에 새겨진 칼칼한 글씨에 행초서의 부드러움을 더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김성덕 선생의 작품은 좋은 글씨에 대한 끊임없는 자문과 자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단한 질문 속에서 한 번도 멈추거나 안주한 적 없는 작가가 보여주는 글씨들의 풍경은 관람객들에게 눈이 뜨이는 것과 같은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2021. 3. 12자료제공 : (사)일중선생기념사업회 <전시정보>신산 김성덕 서전(書展)전시기간 : 2021. 3. 18(목) ~ 3. 24(수)전시장소 : 백악미술관 1, 2층 전시실관람시간 : 10:00 - 18:00주 관 : 사단법인 일중선생기념사업회 *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오프닝 행사는 생략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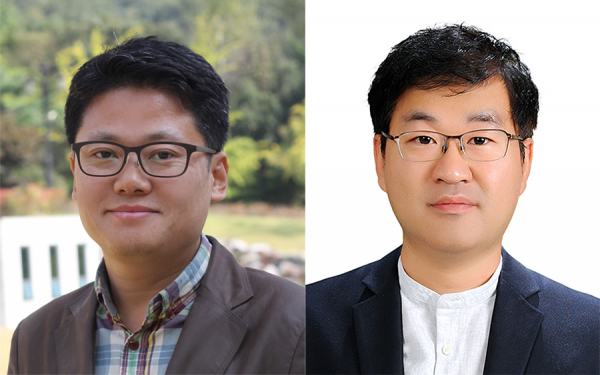
[News]
경기대 전임교수 임용 발표
학교법인 경기학원은 지난해 12월 교수채용을 공고하여 3개월의 심사과정을 거쳐 1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예술체육대학 파인아트학부 서예전공 소속에 성인근(48)씨가, 일반대학원 글로벌파인아트학과 소속에 이재우(41)씨가 각각 선정되었다. 성인근 교수 이재우 교수성인근 교수는 1992년 계명대 서예과에 입학한 후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사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인장사 연구를 비롯하여 한국서예사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과 경기대 강사를 역임했다. 임용 후에는 서예전공 이론 및 실기 교과목을 담당하게 된다.이재우 교수는 2000년 원광대 서예과에 입학한 후 경기대 서예학과 석사를 거쳐 성균관대 동양미학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경기대와 강릉원주대 강사로 활동했으며, 경기대 동아시아예술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했다. 임용 후에는 동양서화전공 중국인 석․박사과정생의 수업과 학사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서예학과 출신으로는 2008년에 장지훈 교수가 경기대 서예학과에 최초로 임용된 바 있으며, 13년 만에 2명의 전임교수가 새롭게 배출된 셈이다. 대부분의 서예학과들이 폐과되고 위축된 상황에서 서예전공자의 전임교수 임용소식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2021. 3. 23글씨21 편집실
-

[Review]
최두헌 두 번째 개인전 <篆篆兢兢, 2021>
최두헌 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 <篆篆兢兢, 2021>이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경주 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 갤러리 달에서 펼쳐진다. 최두헌 · 去來一主人(거래일주인) · 60×42.5cm<篆篆兢兢, 2021>은 전서(篆書)에 대한 예술적 고민과 수행에 대한 개인적 고민을 함께 풀어낸 40여 전각 작품으로 구성된 전시이다. 첫 번째 개인전이 전각의 회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이루었다면 이번 전시는 진한(秦漢)시대의 전극을 기본으로 전각의 기초에 충실했다. 최두헌 · 磨磚成鏡(마전성경) · 『마조록』 中작가에게 전각의 문구들은 평소 수행에 대한 고민을 대변한다. 화두가 사라질 때의 허무함과 스스로 잡힐 때의 희열이 교차하는 그 순간의 찰나를 마전성경이라는 대표적 선구로 대신했다. 최두헌 · 重疊山川(중첩산천) · 『대각국사문집』 <총명원>작가는 “돌 위에 새겨진 문구들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치유가 되길 바란다”며 “글씨든 전각이든 서화 전각예술의 대중화와 특히 전각의 일상적 공유를 위해 여전히 긍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두헌 · 樂在其中(락재기중) · 『논어』 中최두헌 작가는 동국대 한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부산대학교 한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호는 亦時(역시), 時玄(시현)이며, 당호는 如若齋(여약재)다. 최두헌 · 同處並頭(동처병두) · 『법계도기총수록』 中대한민국미술대전, 경기도전, 경북도전, 경인미전, 전국휘호대회(국서련) 초대작가이자 한국서예가협회, 한국전각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통도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으로 있으며 경주에서 전각공방 석가(石家)를 운영하고 있다. 2021. 3. 26글씨21 편집실 <전시정보>최두헌 두 번째 개인전<篆篆兢兢, 2021>전시기간 : 2021. 3. 23(화) ~ 3. 28(일)전시장소 : 경주 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 갤러리 달
-

[Interview]
필묵 속에서 자유를 찾다
(사)일중선생기념사업회 ≪우수작가 초대전≫ 신산 김성덕 서전 인터뷰지난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백악미술관에서 (사)일중선생기념사업회 ≪우수작가 초대전≫ 신산(信山) 김성덕 서전(書展)이 열렸다. (사)일중선생기념사업회가 2014년부터 주관하고 있는 ≪우수작가 초대전≫은 현재 서예계에서 주목받는 중견작가의 전시를 개최해 새롭게 변모해가는 한국 서예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데 그 취지가 있다. 전시 개최에 앞서 글씨21에서는 신산 김성덕 선생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번 전시와 김성덕 선생의 필묵에 관한 담백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 글로 옮긴다. 필묵 속에서 자유를 찾다서예가 김성덕 인터뷰 김성덕: 서예가성인근: 경기대학교 교수 때: 2021. 2. 26곳: 글씨21 성: 오는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김성덕 작가의 백악미술관 초대전에 앞서 전시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가는 작품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서예가 대중에게서 멀어지는 현시점에 작가의 작품세계를 대중에게 친절하게 얘기해줄 수 있는 계기로써의 의미도 있습니다. 김성덕 작가님은 한국에서 대학 서예가 시행된 이른 세대의 그룹들 가운데서도 서예의 본질을 순정하게 추구하고 계신 몇 안 되는 작가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매우 많은 시간을 작업에 몰두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말문을 여는 차원에서 선생님의 작업 외의 시간이 궁금해졌습니다. 서예 외의 시간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보내시는지요? 김: 일부러 특별한 다른 취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서예 외에는 주로 산책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2-3시간씩 늘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성: 작업과 작업 외의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치로 산책을 활용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김: 네, 정리되지 않았던 생각들이 산책하며 떠오를 때가 있고, 걷다 보면 작품에 대한 구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차원에서도요. 전시장 전경성: 어떤 분들은 ‘생각이란 발에 달려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작업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산책을 즐긴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전시가 백악미술관에서의 초대전인데, 백악미술관에서 서예가를 초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언제부터 어떤 계획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김: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일중서예대상과 우수작가상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우연히 선정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선발작가에게 전시장 제공과 전시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 서예가들에게 흔치 않는 기회제공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가 개인전으로서 몇 번째고 현재까지 작품의 방향, 성향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얘기해주시죠.김: 이번이 두 번째고 10년 만에 하는 전시입니다. 우수작가상 선정 이전에 이 전시를 기획했는데 우연히 상과 맞아떨어져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향성과 변화 양상... 글쎄요, 별로 변화가 없더라고요(웃음). 변화하고 싶은데 잘 변하질 않습니다. 못할 것 같으니까 깊이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신산 김성덕 · 春風.秋水 · 20×135cm×2 성: 예. 변화라는 게 어떤 외적인 변화, 형식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방금 말씀 하셨듯이 지킬 건 지키면서 그 안에서 깊이를 더해가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왔다고 이해됩니다. 며칠 전 선생님께서 이번 전시에 출품하실 작품 이미지를 보내주셔서 어제 하루 종일 나름 행복하게 보고 왔습니다. 주로 한문서예가 대부분이며 한글서예가 두 점 정도 포함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이한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한시를 쓰면 한자로 시 원문을 쓰고 협서를 쓰는 방식인데, ‘춘풍대아능용물, 추수문장불염진’을 한글로 쓰고 그 옆에 협서로 한문의 원문을 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인 셈입니다. 김: 전에도 이런 작품을 한두 번 했었는데, 한시 가운데 뜻이 명쾌하게 드러난 문장만 했습니다. (성: 네, 한글로 봐도 이해가 되는..) 네, 그 정도 된 작품을 했기 때문에 한글이 주가 되고 한문이 부수적으로 된 것도 재밌을 것 같았어요. 형식을 바꿔서 운치 있게 해보고자 했습니다. 신산 김성덕 · 趙憲 雙溪石門詩 · 40×180cm성: 이번 전시는 한문서예 위주이고 한글서예는 두 점 정도 출품하셨는데, 한글은 사실 우리글이고 우리말이기 때문에 서예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한글서예의 미래적인 가능성, 가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김: 이번 작품은 한문 위주로 썼었는데, 한글서예도 도전해볼만한 좋은 장르라고 생각해요. 특히 자기감정을 그대로 표출할 수 있기는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한글에 초서를 가미해서 써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신산 김성덕 · 춘향가 중에서 · 90×150cm성: 최근에 선생님 말씀대로 한글에 행초서의 흐름을 가미해서 쓰는 작가들도 있더라고요. 서예가들이 한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 더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이제 한문서예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서예에서는 획질(劃質)을 중요시하죠. 어떤 사람 글씨에서는 나무와 같은 질감이 느껴지고도 하고, 어떤 사람의 글씨는 돌같이 파삭파삭하면서도 단단한, 어떤 사람의 획에서는 유려한 물 같은 성질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건 개인적인 성향과 그 작가의 성정이 자연스레 묻어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작품을 보면서 느껴지는 획의 질감은 금속(金屬)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운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자면 ‘쇠맛’ 같은 느낌입니다. ‘획(劃)’이라고 하는 것은 붓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 용필(用筆)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 획의 성질이 기운생동함도 좋긴 한데, 사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저는 그게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생각해도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성: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싶다..) 네, 중국 현대작가 심붕(沈鵬, 1931~ )의 젊었을 적 작품을 보면 부드러우면서도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강인함이 있더라고요. 그런 작품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가고자하는 방향입니다. 저는 글씨 쓰는 자세가 다른 사람들과 약간 다릅니다. 바닥을 선호하는 편인데 평상시에는 일주일에 하루․이틀만 바닥에서 씁니다. 힘들어서(웃음). 30대부터 바닥에서 쓰다 보니 무릎이 아파서 서예를 더 하려면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 싶어서 주로 책상에서 쓰고 바닥은 이틀정도 씁니다. 성: 바닥과 책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김: 시야가 넓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깨지지 않습니다. 성: 선의 변화는 어떨까요? 김: 선의 변화도 많죠. 물론 현완(懸腕)으로 쓰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벼루를 두 개 놓고, 혹은 대작하면 세 개 놓고, 위치에 따라 먹을 묻혀가면서.. 거기서 오는 자유스러움이 좋습니다. 성: 조금 더 유연해지고 싶다, 아직은 딱딱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한국 서예와 중국 서예의 특성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중국서예는 유려하고 부드럽지만 골기(骨氣)가 부족해 보이기도 하며, 현대의 한국서예는 전예(篆隷) 중심, 특히 중봉을 중요시 여기면서 단단하게 써오는 흐름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국가적 경향성이 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 맞습니다. 그리고 도구에서 오는 차이도 있고요. 저는 이번 작품을 붓 두 자루로 했습니다. 하나는 16cm 되는 긴 장봉과 하나는 무심필 이렇게 두 가지로 했습니다. 요즘은 글씨의 유연함과 유려함을 위해 행초 위주로 임서하고 있습니다. (성: 주로 어떤 자료를?) 요즘은 서위(徐渭, 1521~1593)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 서위가 갖는 매력이 뭘까요?) 제가 보지 못했던 자연스러움이 있더라고요. 중봉에 얽매이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전시장 전경성: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방향으로 나가고 싶다는 획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예에서는 획이 중요하지만 먹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도 중요할 것 같고, 전체 화면에서 공간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의 문제도 작가에겐 큰 고민일 것 같은데.. 김: 저는 공간 구성을 할 때 첫 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첫 줄을 써놓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공간을 잡아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장단(長短), 대소(大小), 비수(肥瘦) 등의 관계가 첫 자를 시작함과 동시에 기준이 되고 이후에 변화합니다.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흐트러지기도 하고.. 보통 작품은 처음 썼던 것이 가장 자연스럽더라고요. 임서는 많이 하되 창작할 때는 한 번으로 끝내야 해요. 성: 그런 부분이 서예라는 장르가 가진 특징이 아닐까 싶네요. 회화 같은 경우에는 고민도 많이 하고 조금 더 고치고 계산해 나가기도 하지만, 서예는 에너지를 쌓아서 한 번에 만들어 내는 일회적인 것, 그게 서예가 가지는 특징이자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 저는 집자 할 때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 작품 할 때는 자유롭고 유연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신산 김성덕 · 毛公鼎臨 · 97×180cm성: 이번 출품작이 전서, 예서, 행초를 포함한 초서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서체씩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우선 선생님 전서 작품의 경향은 모공정을 임서한 작품도 하나 있었고, 대개 금문 위주입니다. 앞서 선생님 작품 전반에서 느껴지는 선의 질감을 ‘금속의 맛’으로 말씀드렸는데, 금문 학습의 영향이 선생님 획 안에 녹아들어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 15년 전까지만 해도 금문 임서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가 금문을 좋아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전서를 많이 쓰셨던 醉墨軒(취묵헌), 소헌(紹軒), 하석(何石) 선생님의 글씨를 많이 따라 썼어요. 임서보다는 차용이었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금문을 잘 쓰려면 행초를 잘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 네, 선생님 금문에서 행기(行氣)라고 하나요, 유동적인 흐름이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았습니다. 김: 금문을 쓸 때 행기를 넣지 않으면 너무 박제화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금문을 쓰되 행초 느낌으로 쓰고 있습니다. 신산 김성덕 · 晏子句 · 33×175cm성: 모공정 임서작품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역입(逆入)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선을 그어가는, 그러면서 금문의 조형들을 만들어나가는 방법으로 임서하고 계시더라고요. 김: 역입을 하면 얽매여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문 쓸 때만큼은 좌에서 우로도 쓰고, 우에서 좌로도 쓰고, 밑에서 위로도 쓰고 그럽니다. 글자 한 자 한 자에서요. 성: 한자의 필순(筆順)이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가 기본적인 건데 솔직히 그 때 그 사람들이 다 지켜서 썼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글씨를 쓰는 사람마다 조형을 만드는 데 편리한대로 썼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김: 자연스러움도 좋지만 어느 정도 절제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신산 김성덕 · 隸書 四首 · 45×200cm×4성: 그렇죠. 자유로움과 법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여기에서 현재적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서 얘기로 넘어갈게요. 선생님 예서는 한비(漢碑)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한나라 민간에서 썼던 간독(簡牘) 자료들의 영향이 커 보입니다. 금문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유연한 흐름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고 계신데, 선생님 예서가 변화되어온 과정을 말씀해 주시죠. 김: 예기비(禮器碑), 사신비(史晨碑) 위주로 임서하다가 한국에서 목간이 유행했을 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은 작품 할 때 따로 경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예를 집자해서 목간처럼 쓰기도 했습니다. 청대의 이병수(伊秉綬), 진홍수(陳鴻壽)의 글씨에도 좋은 글꼴이 있거든요. 따로 특정 자료를 고집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올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추사 글씨를 보다가 청대 글씨를 다시 보니까 이병수, 진홍수의 글꼴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것을 추사는 추사스타일로 발전시켰던 거죠. 오히려 이병수, 진홍수의 예서가 순수하게 쓴 작품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내 행기를 넣고 나만의 글꼴을 넣었던 것 같아요. 전시장 전경성: 네, 어떤 서체를 보던 행기가 전반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행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행서, 초서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 작품에서 느껴지는 행서는 주로 명말청초의 여러 작가들, 특히 부산(傅山)이나 왕탁(王鐸), 서위(徐渭) 등의 매우 자유분방하면서도 낭만적인 경향이 느껴집니다. 선생님이 추구하시는 초서, 행초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김: 처음에는 왕희지(王羲之), 안진경(顏眞卿) 글씨를 많이 썼고, 나중에 왕탁과 부산 등을 썼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 왕탁보다는 부산이 맞는 것 같았어요. 아직까지는 변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신산 김성덕 · 百尺竿頭進一步 · 30×41cm성: 물론 지금의 작품들은 큰 글자들로 썼기 때문에 부산의 대자초서(大字草書) 느낌이 많이 나는데, 그 하나하나의 글꼴들이나 흐름들을 쫓아가보면 부산의 천자문과 같은 소초(小草)의 영향이 저한테는 느껴지더라고요. 김: 부산의 천자문은 써본 적이 없는데, 제가 부산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신산 김성덕 · 朱熹 觀書有感 · 90×150cm성: 이번 전시에 출품한 작품 가운데 유독 눈에 확 들어온 작품이 있었는데, 왕유(王維)의 시 ‘적우망천장작(積雨輞川莊作)’을 광초(狂草)로 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매우 아슬아슬하면서도 호쾌한 느낌이 듭니다. 작품은 작가의 의도에 의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내 의도와 달리 붓이 나를 끌고 갔다고 할까요, 그런 경계에서 나온 작품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매우 인상 깊게 본 작품입니다. 김: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썼던 글씨입니다. 이건 초안이라고 하고 욕심 없이 썼던 거 같아요. 쓰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번 출품작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품이에요, 사실 이 작품을 성박사님이 알아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도 이 작품이 제일 좋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 보통 우리가 ‘득의작(得意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왕희지의 ‘난정서’가 왜 천하제일의 행서냐, 그 당시의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이입되었기 때문이고. 안진경의 ‘제질문고’도 명품인 이유가 당시의 감정이 녹아있기 때문이며, 손과정도 서예가 정말 잘 될 때는 우연히 마음이 동했을 때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작가의 감성이 자연스럽게 풀어져 나왔을 때, 그때가 득의작이 나오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오늘은 붓이 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거기서 조금 오버하면 금방 티가 나거든요. 더 깊이 생각하면 오자를 내거나 글씨를 빼먹는데 그런 게 안생기고 ‘괜찮은데?’ 이 정도에서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5분 정도 손에 힘 안주고 쭉 써 내렸던 것 같아요. 신산 김성덕 · 陶潛 讀山海經 · 95×200cm 성: 아무튼 정말 좋은 작품 만들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눈이 정말 시원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전각 분야에서도 많은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전각을 따로 출품하시지 않으셨죠? (김: 네,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평소 전각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김: 전각은 문자예술이면서도 건축적인 측면, 인문학적 측면이 포함된 종합예술이잖아요. 전각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조형감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한 전각의 7할 정도는 서예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옛날사람들이 그런 얘길 했잖아요. 서예 하는 사람은 전각가가 될 필요가 없지만 전각가는 서예가가 되어야한다고. 그 말에 동의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작가 스스로 전각을 새겨 작품에 찍을 때 안목이 틔는 것 같아요. 전각을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눈이 떠지는 느낌을 받아요. 성: 그렇죠, 한 치의 공간에 천지를 담는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작은 공간에 글자 몇 자를 완성도 있게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간에 대한 학습, 감각이 늘어나는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신산 김성덕 · 杜甫 絶句 · 90×150cm성: 이번 전시의 출품작 가운데 진계유(陳繼儒)의 시구를 대련으로 쓴 작품 ‘오늘 나눈 대화가 10년의 독서보다 낫다’ 내용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도 오늘의 대화에서 많은 부분을 배우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서예라는 분야의 고유성, 그리고 근본에 대해서 매우 치밀하고 깊게 파고들면서도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앞으로 작업 방향, 꿈꾸고 계시는 작품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초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요. 한학도 더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작품하면서 관지 쓸 때 제 감정을 표현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행초 공부를 많이 하고, 더 진지하고 깊이 공부하고 싶어요. 저는 현대적인 것은 잘 못하니까 서예 안에서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에서. 전시장 전경성: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김: 학정(鶴亭) 이돈흥(李敦興) 선생님께서 돌아가신지 1년 조금 더 됐거든요. 선생님 계실 때 이 전시가 잡혔어요. 너무 허전하지만 지금도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서예가의 정신, 서예가의 길을 앞으로 가슴 속 깊이 새기면서, 이번 작품을 선생님 영전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 3. 30글씨21 편집실<전시정보>(사)일중선생기념사업회 ≪우수작가 초대전≫신산 김성덕 서전전시기간 : 2021. 3. 18(목) ~ 3. 24(수)전시장소 : 백악미술관 1, 2층주관 : (사)일중선생기념사업회
-

[News]
2021 이즘한글서예가전
전시장 전경지난 3월 24일(수)부터 3월 30일(화)까지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2021이즘한글서예가전’이 열렸다. 이즘한글서예가전 추진위원회 5인(구자송, 신명숙, 이종선, 최민렬, 홍영순)은 한글서예의 시대적 소명에 부응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 한글서예의 미래지향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전시의 취지라고 밝혔다. 근래에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진한글작가 32명이 참여하였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2021 이즘한글서예가전 참여작가구자송 김광희 김두경 김명자 김선숙 김진태 류지혁 문재평 문영희 박경희 박병옥 박정숙 서복희 서혜경 신명숙 오병례 유혜선 은성옥 이정옥 이성숙 이종선 장용남 정복동 정영필 조주연 조현판 지남례 천갑녕 최미연 최민렬 최재연 홍영순유정 김명자 · 이철환의 아버지의 사랑은 등대같은거야 · 35×110cm심재 김선숙 · 송강 정철의 장진주사 · 38×140cm월당 김진태 · 류시화님의 봄비 속을 걷다 · 33×93cm서현 문영희 · 박목월의 나그네 · 60×35cm새움 박경희 · 정지용 춘설 · 35×80cm슬기 오병례 · 애련설 · 48×135cm매당 유혜선 · 사설시조 세월 · 68×130cm한얼 이종선 · 허영자 감 · 60×114cm2021. 4. 1글씨21 편집실<전시 정보>2021 이즘한글서예가전전시기간 : 2021. 3. 24(수) ~ 3. 30(화)전시장소 : 인사동 한국미술관 3층 전관주최 : 이즘한글서예가전 추진위원회
-

[News]
다시, 봄
전시장 전경북촌 가고시포갤러리에서 벚꽃이 만개한 요즘과 잘 어울리는 전시가 열렸다. 2021년 3월 31일(수)부터 오는 4월 4일(일)까지 열리는 ‘다시, 봄’ 전시다. 전시에 참여한 권진윤 · 김지선 · 박지영 · 박지혜 · 손아영은 우헌 조용연 작가의 ‘옹언글씨’ 문하생들로,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전시를 개최했다. ‘봄’을 주제로 정한 다섯 작가는 봄에 트는 새싹을 다시 꿀 수 있는 꿈으로 비유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꿈’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다시, 봄꿋꿋이 겨울을 이겨내고 봄날이 찾아왔는가다시, 봄우리들은 다시 돌아본다.뜻하지 않음으로 서로의 거리가 멀어진지난 봄, 여름, 가을, 겨을..쌀쌀한 바람속에 피어나는 꽃망울 사이로일상을 다시 바라본다.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는 나날은 계속되고,기다린 사람에게도,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봄은 온다.다시 봄을 꿈꾸는 다섯 작가들의 시선을 전시하며… 권진윤 김지선 박지영 박지혜 손아영권진윤 · 정지의 힘 · 70×60cm김지선 · 봄을 맞이하는 자세 1 · 48×42cm │ 봄을 맞이하는 자세 2 · 48×50cm박지영 · 봄, 스며들다 · 53×40.9cm박지혜 · Walking Up(퍼플레인) · 45×32cm손아영 · 일곱가지 죄 · 48×70cm2021. 4. 2글씨21 편집실<전시정보>다시, 봄전시기간 : 2021. 3. 31(수) ~ 4. 4(일)전시장소 : 가고시포갤러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가길 16)참여작가 : 권진윤 김지선 박지영 박지혜 손아영
-

[News]
사단법인 서울서예가협회 발족
(사)서울서예가협회 초대 이사장 덕암 최영숙서울서예가협회는 사단법인으로 개편되어 ‘사단법인 서울서예가협회’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알렸다. 사단법인 서울서예가협회는 2020년 11월 16일 강남구 역삼동 재가 노인종합사회 복지센터에서 덕암 최영숙 선생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하였으며 그동안 코로나19 집합금지 등 사회적 요건으로 인해 지난 3월 최종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사단법인 서울서예가 협회의 전신이었던 서울서예가협회는 1987년 9월 19일 지담 강희식 선생 외 4명이 모임을 갖고 강희식 선생 외 20명으로 발대식이 거행되었으며 그 시작은 서예의 본질을 읽어내고 법고창신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창립된 단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서예가협회의 초기 활동에는 우죽 양진니 선생의 서법 강좌, 농산 정충락 선생의 서예 평론, 추강 장성연 선생(작고)·어운 송명신 교수(중국하문대교수)의 변려문, 논어 이인편, 한문해석 등 여러 장르의 학습을 통해 회원들 간 상호교류를 해왔으며 아울러 해외 교류전을 격년으로 발표하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새롭게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서예가협회는 한국 서예의 진흥과 가치를 제고하며 한국 서화 문화의 전통성과 예술성을 계승·발전시켜 문화 선진국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국 서예 문화 발전을 위한 문헌 연구, 학술 세미나 지원, 간행물 발간, 전시 개최 및 홍보, 전문 인력 양성, 유관 단체와 서예 문화 교류, 협력 사업 등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 예술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서울서예가협회는 현재 서예·문인화·민화·캘리그라피 강사진들과 활발히 활동 중인 서화가들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의 자격은 문호를 개방하여 서예, 서화, 그림, 캘리그라피 등을 사랑하고 취미로 배우고 싶은 분은 누구나 환영한다고 전했다.금번에 새롭게 선출된 임원은 아래와 같다. (사)서울서예가협회 임원명단초대 이사장 덕암 최영숙고문 구산 김례문 희재 한상봉자문위원 어운 송명신 해란 이정순부이사장 심은 이기종 중일 제해석상임이사지담 강희식 평원 오혜남이사 전희진 박종경 사무국장호담 탁영숙감사응도 김용창2021. 4. 6글씨21 편집실
-

[News]
화곡서춘식·고원서연숙 연지탐화조음전
전시장 전경(좌) 화곡 서춘식 · 무궁화 · 35×99cm / (우) 고원 서연숙 · 계룡시 공원에 핀 무궁화 · 100×60×170cm지난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인사동 백악미술관에서 화곡 서춘식·고원 서연숙 蓮枝探花造吟展(연지탐화조음전)이 열렸다. 연지탐화조음전은 화곡 서춘식 선생의 글씨와 고원 서연숙 선생의 종이로 빚은 야생화아트가 어우러진 전시다. 화곡 서춘식 선생은 강암 송성용 선생의 문하생으로 서예를 사수하는 등 평생 한학을 수학했다. 고원 서연숙 선생은 대한민국수공예명인 야생화아트 1호로 (사)한국수공예협회 공주본부장·야생화연구회장을 재임 중이다. 서연숙 선생은 야생화아트를 ‘잠시 피고 지는 것이 아쉬워 그 꽃을 손끝으로 피워 가까이 두고 늘 감상할 수 있는 공예’라고 소개했다. 2021. 4. 9글씨21 편집실<전시정보>화곡 서춘식·고원 서연숙 蓮枝探花造吟展전시기간 : 2021. 4. 1(목) ~ 4. 7(수)전시장소 : 백악미술관